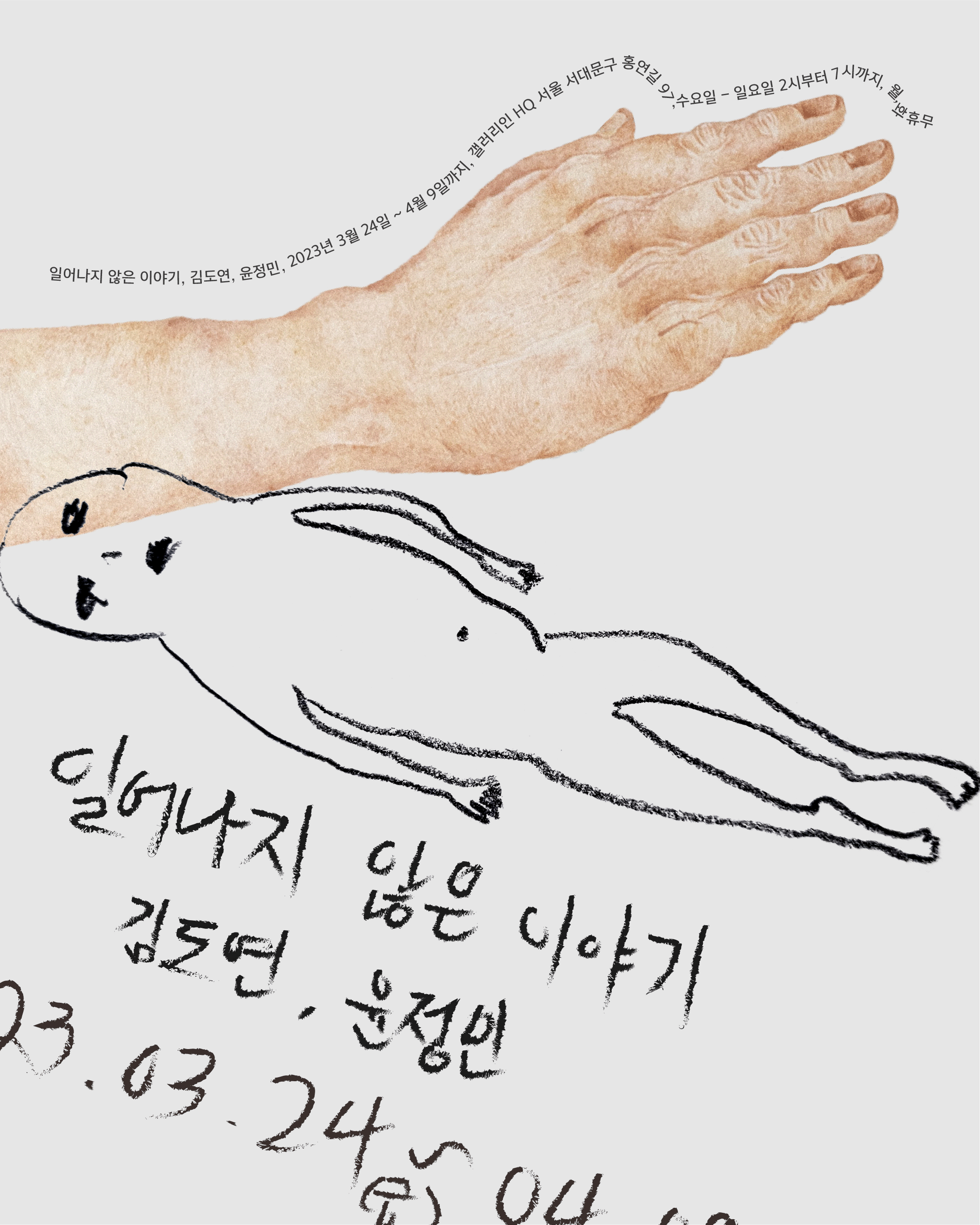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
김도연, 윤정민 2인전
2023. 3. 24(금) - 4. 9(일)
글 : 장민주
디자인 : 장원호
촬영 : 최철림
갤러리 인 HQ
서울시 서대문구 홍연길 97 1층, 지하 1층
14:00 - 19:00
수 - 일 (월, 화 휴무)


〈매화향 가득한 섬에 찾아온 방문자〉, 장지에 유화, 210x150cm, 2023
 〈알을 낳고 날아간 새〉, 장지에 유화, 75x105cm, 2023
〈알을 낳고 날아간 새〉, 장지에 유화, 75x105cm, 2023 〈매화〉, 천에 유화, 32x32cm, 2023
〈매화〉, 천에 유화, 32x32cm, 2023



 〈수풀 속에서〉, 도자기, 22x21x3.5cm, 2022
〈수풀 속에서〉, 도자기, 22x21x3.5cm, 2022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을까〉, 장지에 유화, 121x50cm, 2020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을까〉, 장지에 유화, 121x50cm, 2020
〈노래에 눈을 뜨고 감고〉, 장지에 유화, 26x37cm, 2020
〈그 날의 달을 찾아가보자〉, 장지에 유화, 45x42cm, 2020
〈늦가을의 월광욕〉, 장지에 유화, 31x32cm,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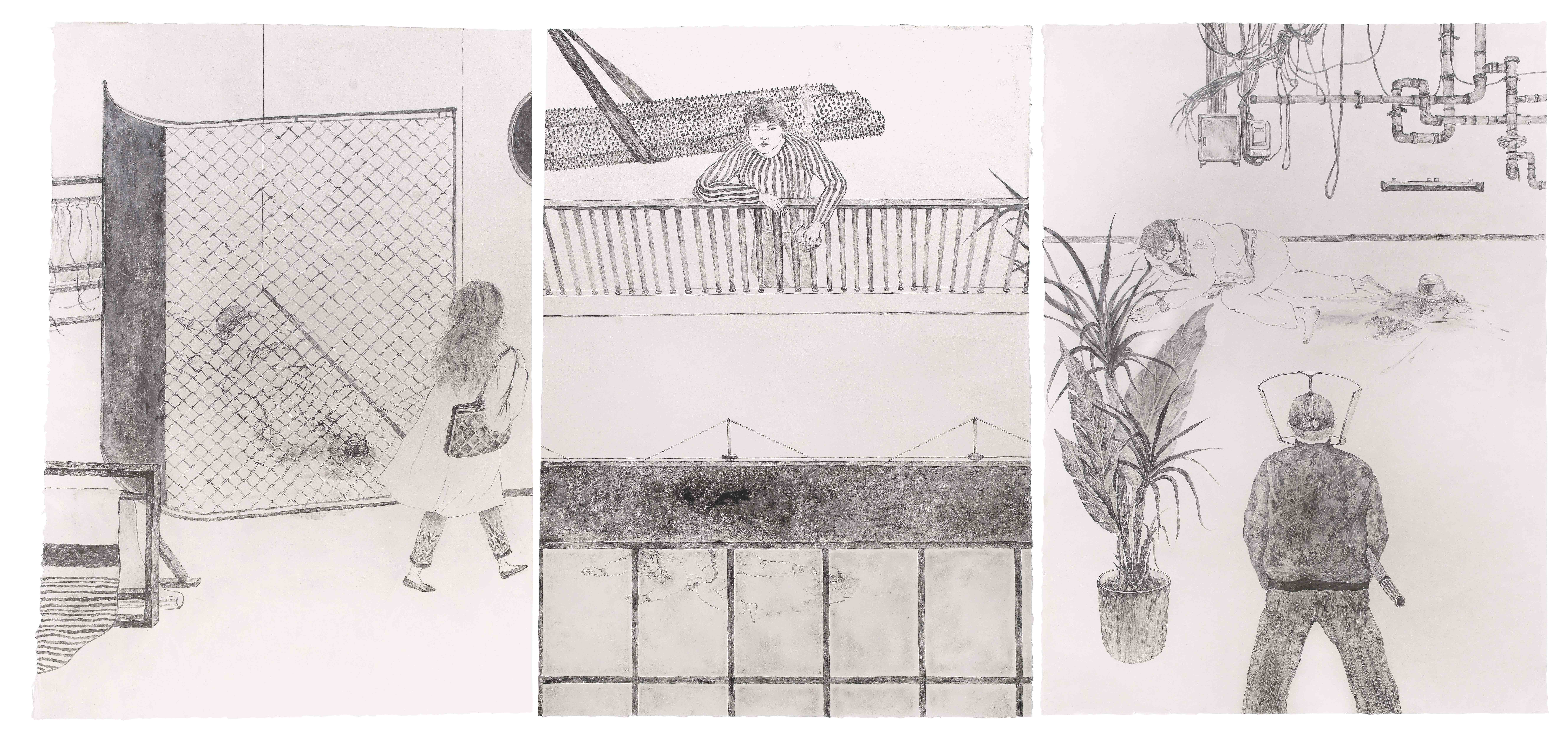 바닥에 조용히 누워보기, 장지에 유화, 90x73cm, 90x73cm, 90x73cm, 2017
바닥에 조용히 누워보기, 장지에 유화, 90x73cm, 90x73cm, 90x73cm, 2017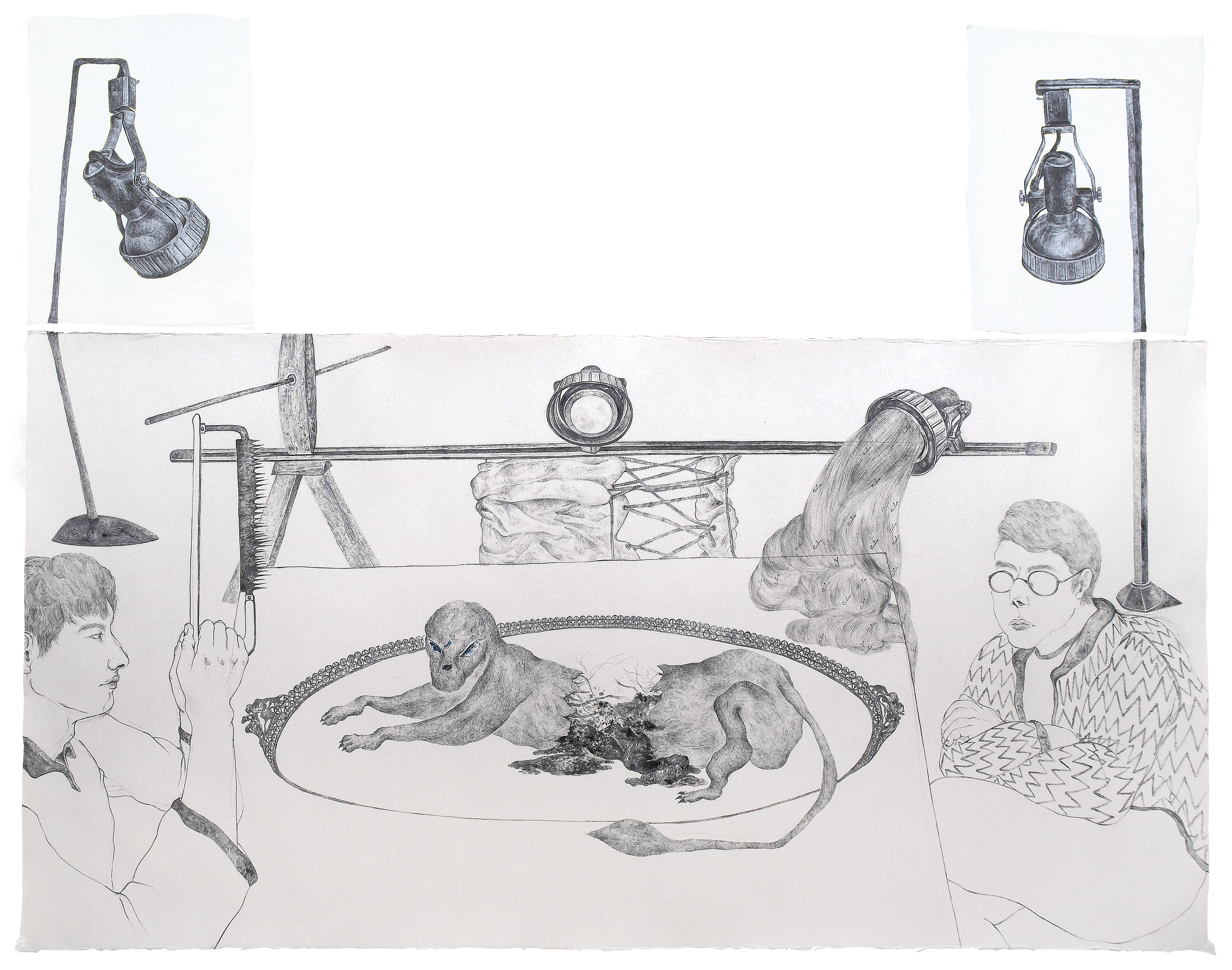 흘러내리는 y에 대해, 장지에 유화, 43x31cm, 83x179cm, 43x35cm, 2017
흘러내리는 y에 대해, 장지에 유화, 43x31cm, 83x179cm, 43x35cm, 2017



도연과 정민의 대화를 읽고
글: 장민주
1. 정민은 독일에서 돌아온 후 무려 14마리의 거미를 입양했다. 정민의 첫 거미는 12년을 살았다고 한다. 모든 생물이 크기에 비례하여 사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작은 동물은 짧은 삶을 긴 동물은 긴 삶을 갖기 마련인데 고작 손바닥만 한 거미가 12년의 세월을 산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궁금해졌다. 정민에게 왜 그렇게나 많은 거미가 필요했던 것인지.
독일에서 예기치 않게 돌아왔고 진단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거미나 키워보자”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한번 들여온 거미는 장장 십 년을 함께할 텐데 그렇게 많은 거미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많은 거미를 들여온 것은 일종의 버킷리스트였다는 답변을 들었다. 정민이 처음 키운 거미는 순하고 느리다고 했다. 그런 거미의 성격은 우연이 아니었다. 정민은 거미를 좋아하지만, 겁이 많은 탓에 거미를 무서워했다. 그렇기에 온순한 거미가 필요했던 것이다. 일종의 타협인 셈이다. 하지만 버킷리스트를 고민하는 정민에게 더는 타협이 필요하지 않았다. 14마리의 거미는 지금껏 키우고 싶었던 모든 거미를 불러모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개중에는 아주 사납고 아주 빠른 거미도 있었다.
정민의 거미 이야기에서 아이러니를 발견했다. 정민은 글에서 자신이 거미를 통제한다고 말했다.
“사실 거미는 독이 있고 매우 사나워서 두려운 존재지만,
그저 작은 동물이고 유리상자 안에 갇혀서 나에게 통제되고 있지. 자기가 통제되는지도 모른 채 말이야.
그런 무력한 동물의 모습을 보는 게 아마 짜릿했던 거 같아.
사납고 방어적(공격적)인 녀석이 아무것도 못 하고 내 핀셋에 무력하게 사육당하는 모습?”
하지만 정민의 막상 거미를 무서워했다. 그걸 통제라고 할 수 있을까?
그저 작은 동물이고 유리상자 안에 갇혀서 나에게 통제되고 있지. 자기가 통제되는지도 모른 채 말이야.
그런 무력한 동물의 모습을 보는 게 아마 짜릿했던 거 같아.
사납고 방어적(공격적)인 녀석이 아무것도 못 하고 내 핀셋에 무력하게 사육당하는 모습?”
하지만 정민의 막상 거미를 무서워했다. 그걸 통제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14마리의 거미 중에는 정말 통제할 수 없이 빠르고 사나운 거미가 있었고 겁이 많은 정민은 혼자 거미집을 청소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치워줘야 했다. 비슷한 아이러니를 도연 작가의 글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연 작가는 햄스터를 키운 경험을 말하며, 우월감에 관해 이야기했다.
“거대한 관찰자의 모습으로 내가 마음껏 다룰 수 있는 작은 생명체가 먹고 자고 싸는 걸 본다는 점이
나를 우월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
나를 우월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
나는 여러 종류의 햄스터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위의 문장에 이어지는 도연 작가의 경험에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야행성의 햄스터가 박스를 발톱으로 시끄럽게 긁어댔어.
내일을 위해 자야만 했던 나는 덜 뜬 눈으로
불투명한 유리 화병에 대충 찢어낸 휴지 몇 조각과 조금의 해바라기 씨를 햄스터와 함께 넣고 다시 잠에 들었지.”
내일을 위해 자야만 했던 나는 덜 뜬 눈으로
불투명한 유리 화병에 대충 찢어낸 휴지 몇 조각과 조금의 해바라기 씨를 햄스터와 함께 넣고 다시 잠에 들었지.”
햄스터는 작은 체구와 별개로 존재감이 대단한 동물이다. 하나는 냄새가, 하나는 소리가.
햄스터는 짖지도 울지도 않지만, 소음이 심각하다. 철창을 이빨로 갉아대고, 케이지의 모서리 바닥을 땅굴 파듯이 쉼 없이 박박박 긁어대고, 벽을 타고 계속 점프하고, 무슨 약이라도 한 것처럼 미친 듯이 쳇바퀴를 돌린다. 하필 밤만 되면.
그래서 낮에는 잔뜩 귀여워하며 즐기던 것을 밤만 되면 소음을 견디다 못해 반쯤 미쳐서는 햄스터를 야구공처럼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래서 도연 작가가 햄스터를 유리로 된 화병에 가둬두었듯이 나도 밤이면 햄스터 케이지를 통째로 들어 다른 방에 격리 시키거나 그도 거슬리는 날에는 갉을 수도 긁을 수도 점프할 수도 쳇바퀴를 돌릴 수도 없는 작은 공간에 가둬둔 적이 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우월감은커녕 내 정신은 햄스터에 잔뜩 지배된 상태였다. 통제했다는 믿음은 무엇일까.
2. 두 작가에게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도연 작가에게는 나비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정민에게는 거미에게 물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도연 작가가 나비를 보았다면? 정민이 거미에게 물렸다면?
3. 도연 작가가 질병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언어의 한계로 이어지는 지점이 흥미로웠다. 아직 도연 작가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저 작가의 그림을 봤고 작품을 설명하는 글을 읽었고 이야기를 조금 전해 들었을 뿐이라, 도연 작가라는 사람을 잘 모르지만, 한때의 내가 미술을 떠나 문학을 선택한 이유가 어쩌면 도연 작가가 미술을 선택한 이유와 맞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내가 미술을 떠난 이유는 미술이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서였다. 어쩌면 그것이 미술의 존재 이유이지만, 과거의 난 내가 만든 작품을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길 바랐고, 그렇지 못해 답답했고, 끝내는 미술이 거짓되었다고 생각해 결국 언어 그 자체로 이루어진 문학을 선택했다.
물론 지금은 그때의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림과 조각이 언어로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는 생각은 아직도 유효하다.
한국에서는 나비를 나비라 부르고 나방을 나방이라 부른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나비와 나방을 모두 빠삐용이라 부른다고 한다. 대개 나비는 아름답다고, 나방은 징그럽다고 생각한다. 나비와 나방이 뒤섞인 빠삐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프랑스인들은 과연 빠비용을 아름답다고 생각할까? 징그럽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어떤 빠삐용은 아름답고 어떤 빠삐용은 징그럽다고 생각할까?
만약 프랑스인들이 빠삐용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방이라면, 난 프랑스로 이민을 갈 것이다. 징그러운 나방인 채로 한국에 사는 것보다는 아름답기도 징그럽기도 한 빠삐용들에 뒤섞여 (어쩌면 아름답기만 한,) 사는 편이 좋을 테니까.
“그러다 알게 된 나의 질병 소식은 내게 반가움을 주었어. 내가 느낀 것이 실재했단 것이니까.”
한 작가에게 진단은 반가움이었고 한 작가에게 진단은 절망이자 죽음이었다. 반가움과 절망 모두 언어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한 작가에게 질병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비로소 언어로 확정받는 일이었고, 한 작가에게 질병은 그 질병에 깃든 모든 죽음과 두려움의 언어가 쏟아지는 일이었다.
4. 두 사람은 반인반수에 관해 이야기를 확장해나가고 있는데, 재미있는 지점은 인간의 위치에 다른 인간을 넣어보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넣어보고 있다는 점이다. 도연 작가가 이 부분에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민은 도연 작가도 자신도 오직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두 작가는 인간에 위치에 자신을 넣어 동물이 되는 자신을 상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5. 두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은 다음의 특성을 가졌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언어가 필요없고), 통제하거나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
6. 만약 동물이 될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새를 꼽는다. 이유는 단연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연 작가의 생각은 달랐다. 도연 작가에게 새란 날 수 있는 것보다도 어깨에 앉아 눈을 맞추는 동물이었다.
“인간에게 길들여지더라도 인간의 발아래가 아닌 인간의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어깨에 앉아있는 존재.”
7. 까마귀는 통상 죽음과 연관이 깊은 새라는 인식이 있다. 까마귀가 나타나면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있고 까마귀가 동물이나 인간의 사체를 뜯어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 것이다. 정민이 말하는 새 이야기에는 많은 아이러니가 담겨 있다. 정민은 새가 싫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좋아하는 거미에게 있어 새는 포식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막상 정민이 일상에서 마주한 새는 대부분 죽거나 죽을 위기에 처해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까마귀가 좋은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영리하고 새까매서 라고 한다.
“이후 독일에서 유학생활 중 까마귀를 또 보게 되었지.
여기 까마귀는 상당히 크고 사람을 두려워 하지 않는 것 같았어.
그냥 거리인데 걸어댕기더라고 당당하게. 멋있었어.
그리고 최근 한라산을 등반하다가 산 정상 가기 전 최대 휴식처가 있어.
거기에서 쉬는데 사방에 까마귀 떼가 있더라고.
그리고 가까이 와서 음식을 구걸하고 내 주변에 퍼덕거리며 내가 먹는 것을 관찰했어. 재미있었지.
새는 항상 벌레를 먹는 포식자였지만 내가 가까이서 마주했던 새들은 대부분 죽었거나 죽을 운명의 새들이었던 거 같아. 그렇지만 까마귀는 달랐어. 게다가 영리하며 새까만 모습이 참으로 매력적인 거 같아.”
까마귀는 죽음의 동물일까 삶의 동물일까.

